|
“물결 일지 않는/ 재스민 향기가 넘치는/ 흠 없는 바다/ 사랑을 운반하는 것 외에/ 상륙하거나 급수한 적이 전혀 없는/ 무지개 보트/ 그 항구엔/ 미움도/ 전쟁도/ 한 때 획득하려 했던 진실도 없네/ 더 이상 진실에 대한/ 논쟁조차 없네.”(뚜카메이 라힝의 시 ‘항구’ 중에서)
“난 학생들의 지리책 속에서 읽고 있다/ ...난 무대 위의 벨벳 커튼과 액션 뒤에서 일어난 것들을 읽고 있다/ 나는 읽고 있다/ 아주 많이 읽고 있다/ 난 이런 일들을 말하려 애써왔지만/ 날 제발 용서해다오/ 어느 침묵하는 영혼처럼 다른 이들이/ 듣거나 알도록 하는데 무기력할 뿐이니.”(킨 아웅 에이의 시 ‘어느 침묵하는 영혼의 책’ 중에서) 독재자의 폭력을 세상에 고발하는 버마 민중시다. 너무나 광포하고 잔혹해서 그랬을 것이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 하지만 겉은 꽃과 향기로 장식된 표리부동. 칼보다 강하다는 펜을 들고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인의 처연함이 짙게 묻어난다. 골방의 길고 긴 한숨이 세상에 터져 나온 날 그들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논쟁을 시작한다.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모임’(이하 버마모임)이 독재정권에 신음하는 버마의 아픔을 노래한 시집 하나를 내놨다. 시비평가인 마웅 타 노에가 2008년 영어로 펴낸 ‘버마시선집’(Burmese Verse a Selection)을 버마모임의 임동확 회장(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이 우리말로 옮긴 것. 마웅 스완 이(필명, 본명 우 윈 뻬)가 영역한 작품 몇 개를 추가했다. “진실은 없고, 제발 용서해다오” 단순한 번역 시집은 아니다. 소개된 킨 아웅 에이는 버마모임이 이미 작년 한국에 초대해 시낭송회를 하고 그의 시를 한국에 소개한 적이 다. 여기 실리진 않았지만 재작년엔 망명 시인 마웅 소 챙을 초청하기도 했고. 그러니 시선집은 버마모임의 2년이 넘는 족적을 오롯이 담은 그릇이라고 봐야 한다. 옮긴이의 하얗게 지새운 밤과 각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모임에서 버마모임 회장이자 옮긴이인 임동확 시인은 “시의 번역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괴감을 표현한 뒤, “하지만 양국, 그리고 작가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몸짓이라도 보여줘야겠기에 시작했다”며 “조금 낯설지만 문자나 부호 뒤에 숨겨진 버마인의 ‘말하는 침묵, 침묵하는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임 시인은 이어 시 하나를 낭송했다. 고인이 된 ‘마웅 처 네’ 시인의 ‘물고기’라는 작품인데, 그는 낭송에 앞서 “엄청난 반전의 시”라며 번역 중 받았을 진한 감동을 표현했다. 사실 ‘엄청난’이라는 단어는 작가(나같은 언론인에게도 마찬가지)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이니까. “내 인생 전부/ 난 결코 한 마리 물고기도 잡아본 적 없다/ 그런데 보라구/ 내가 한 마리 잡았을 때/ 그건 거대한 우주 그 자체다/ 그 걸 끌어올리면서/ 내 낚싯대는/ 무지개처럼 휘어지고/ 이번에 내가/ 낚이고 만다.” 문자 뒤 숨긴 ‘말하는 침묵’
식민지 해방 공간에서 미얀마 민족문학을 이끌었던 시인들이며 몇 분은 이미 작고했다. 남은 대부분의 시인들도 고령이며 문단의 원로들이라고 한다. 킨 아웅 에이가 1956년생으로 가장 어린 정도. 이들은 식민지 압제, 그 뒤 이어진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인들의 아픔을 작품에 표현했다. 먼저 식민지에서 해방,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문명의 이기와 파괴를 묘사한 따킨 꼬더 마잉(1876~1964)의 ‘오지의 결혼식’은 깊고 깊은 정글 속까지 파고든 개발과 환경·문화유산 파괴, 그리고 이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표현했다. “내 나라 오지에 지금껏 남아 있는 결혼식은/ 좋은 전통의 하나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내게 외양간을 주었죠/... 아직 나의 오랜 거점이었던 거기 오지에 있었을 때/ 키 아저씨가 빚진 수백 짜트를 갚으란 요구에, 난 말했지/...잘생기고 포동포동하며 생기에 넘친 쌍둥이 수소들을/ 사원건설업자에게 넘겨버릴 테니/ ...그걸로 충분치 않거든.../ 마을 동쪽에 있는 농토를 팔아버리세요.” 이어 독재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던 후배 시인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조국이 압제자 손에 넘어가 아픔을 몸소 겪어야 했는데, 다시 어둠 속에 갇힌 사랑하는 조국을 보며 온 몸으로 흐느껴 운다. 말 한마디 글자 한 줄 잘못 썼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세상에서도 그들은 펜을 놓지 않았던 것. “어둠의 베일이 걷히고, 너흰...” “그 밤/ 처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 불이 꺼졌고-어둠이 밀려왔지/ 더듬거리며 난 내손을 뻗어/ 여리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가냘프며.../ 불꺼진 밤/ 순간들이 지나고, 어둠의 베일이 걷힌 후/... 너희들이 눈에 익은 것처럼 분명하게 보았던/ 그들의 위장과 등짝에/ 숨기고 도주시키는/ 고문기술자와 희생자들... /벌거숭이로 드러나고 있다.”(다공 따야의 ‘불꺼진 밤’ 중에서)
“차창 곁에서/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조지 인형은/...조지는 요술지팡이를 틀림없이 갖고 있긴 해/ 하지만... 스프링이 작동되어 왔다갔다 할뿐/ 춤출 때조차도, 거기에/ 꼭두각시 끈이 달려/ 차 밖을 벗어날 순 없지/ 아직도 부귀와 행운을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에 영광된 자리에 벌서며/ 거기에 매달려 춤춰야만 하는/ 그 팔자는 그 주인 팔자이기도 하지.”(띤 모의 ‘조지인형’ 중에서) 마침내 시인들은 분노를 폭발한다. 가슴 속 깊이 간직했왔던 호통이자 소소한 반역이다. 이른바 ‘말없는 침묵’ 보다 더 무서운 ‘침묵의 언어’들을 뿜어낸다. ‘탄쉐’ 정권이 그토록 무서워한다는 ‘이심전심’을 노리며. ‘8888민중항쟁’, ‘샤프란혁명’을 향해... “산산이 부서진 벽돌들을/ 힘껏 잡아당겼을 때 그 속에서/ 아아 석상하나 튀어 나왔네/ 누구나 그걸 보면 순종케 하는/ ...어떤 독재자가 무엇 때문에 한 인간을/ 돌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가?/ 그리고 얌전히 손바닥을 들어올린 채/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는가?/ 언제 그 자는 그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마웅 스완 이의 ‘역사학자의 한마디’ 중에서) “난 홀로 갈망하네/ 12월이여, 하지만 위대한 네 하늘은/ ...칼로 난도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총질을 해대건만/ 12월이여, 너의 날들은 아직 푸르네/... 저리 가벼려다오!/ 12월이여, 그리고/ 네 위대한 하늘과 함께/ 네 모든 것과 함께 사라져다오/ 난 바로 내 그리움을 견디고 있을 테니!”(꼬 레이의 ‘하얀 그리움’ 중에서)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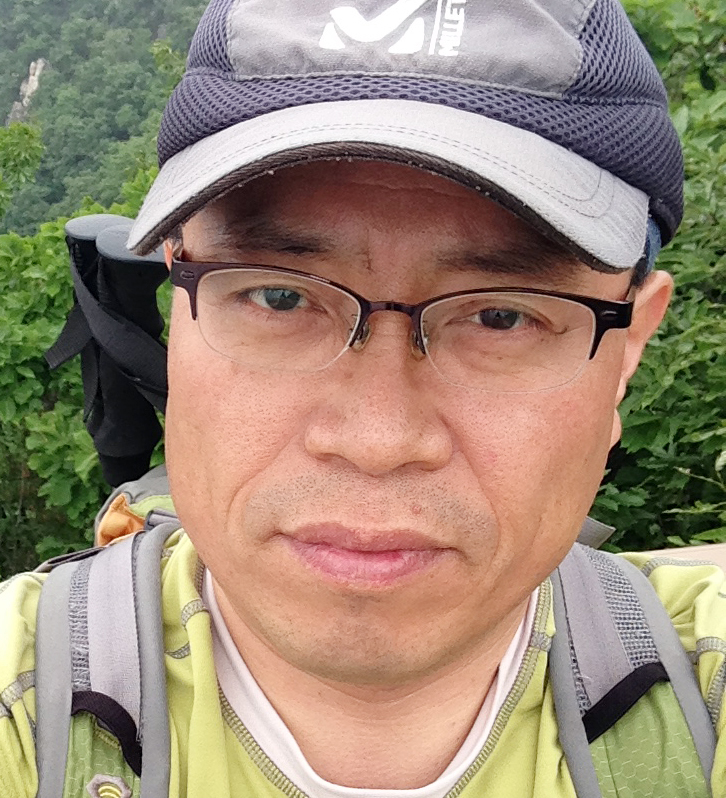 평화를 사랑하는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광장에서 쏘는 현장 보도. 그리고 가슴 따뜻한 시선과 글...

댓글
시집, 버마, 어느 침묵하는 영혼의 책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