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담꽃
최기순詩
할아버지는 눈이 컴컴하고 손가락이 길고 키가 껑충해 영 겁 많은 수사슴을 연상시키는, 할머니 말로는 어느 한 구석 든데 없는 남정네였다는데 퉁소 하나는 아주 잘 불었단다 그런 할아버지를 닦달해가며 할머니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저 집은 쓰러지려야 쌀가마 때문에 안 쓰러진다.”는 말을 들을 만큼 살림을 일구어, 대청마루가 널찍한 집을 짓고 뒤뜰에는 호두나무 아래 평상을 놓아 백리 근동에서 집 구경을 왔다고, 그 집에서 아들딸 육 남매를 낳아 키웠다고 한다 사람은 그저 부지런하고 손끝이 여물어야 한다고 틈만 나면 할머니는 내 귀에 대못을 박아댔는데 어쩐지 나는 흰 중의 적삼에 우수 서린 얼굴로 퉁소나 불다가 환갑도 못살고 간 뒷동산 할아버지 산소 앞, 낙엽 더미 위로 피어오르던 푸른 용담 꽃에만 마음이 갔다 할머니는 제 할애비를 닮아서 손가락이 긴 것이 밥 얻어다 죽도 못 끓일 인사라고 혀를 끌끌 차곤 했다 시리게 하늘 맑은 날 나에게로 향하는 길이 어두워 문득 찾아가 보면 할아버지는 그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봉분 앞에 여전히 용담꽃 푸르게 피워 놓고 있다 △최기순 - 경기 이천 출생. 2001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덧붙여] 그리움은 중요한 시상. 현실적일 수도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사실에도 또는 꿈속에도 존재한다. 용담꽃은 진한 그리움이다. 할아버지 봉분 앞에 피어난 푸른 용담꽃을 본 날 밤 꿈을 꿨다. 중의적삼에 키가 훤칠하고 손가락이 긴 하얀 남자가 퉁소를 그리 잘 불었단다. 자신과 손가락이 꼭 닮은 우수어린 남자가. 그리웠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회한 섞인 추억으론 차마 채울 수 없었던 텅빈 가슴 한 구석. 그토록 애처로운 그리움이 허허롭게 피어난 푸른 꽃 한 송이에서 진하게 묻어났다. 장롱 서랍 속 꼭꼭 숨겨둔 사탕 한 알, 과자 한 봉지 몰래 꺼내 예쁜 손녀에게 건넸을 손가락이 긴 남자. ‘든데 없는 남정네’ 소리는 이미 시인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밥 얻어다 죽도 못 끓일’ 손녀는 그래서 한 번 본 적 없는 꿈속의 그 남자가 그리운 것이다. 할머니가 아무리 혀를 끌끌 차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리움은 가슴 한 구석이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공허함으로 피어나는 것. 용담꽃처럼. 그 남자의 허허함에 더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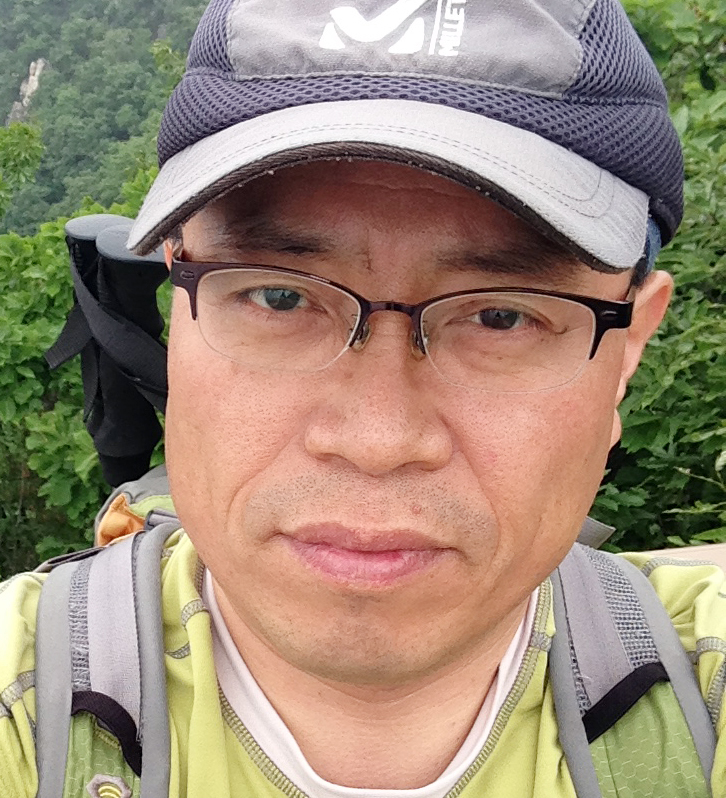 평화를 사랑하는 최방식 기자의 길거리통신. 광장에서 쏘는 현장 보도. 그리고 가슴 따뜻한 시선과 글...

댓글
버마작가모임, 시, 최기순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