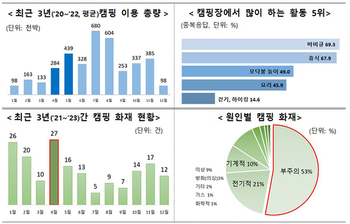시월의 마지막...그 스산한 바람 속에 젖은 영혼은 누구나 시인 아닌 시인이게 한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애써 숨기고픈 국화꽃 젊음.
시리고 젖은 바람이 불면 몸이 기상예보가 되었고, 하룻밤 자고 나면 주름져 구겨진 까칠한 피부에 점 같은 것이 생기곤 한다.
부엌찬장에서 뭘 가지고 오겠다고 가면 그것이 무엇이더라 캄캄하다.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애써봐야 헛일. 할 수 없이 헛걸음하고 돌아오면 기억이 다시 살아나 쓴웃음을 짓는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우주의 질서, 인간은 무력한 유한자(有限者), 탐진치(貪瞋痴)의 삼독 (三毒)에 절여진 백팔번뇌가 득실거리는 추물, 온 길 되돌아보면 불안과 걱정, 분노와 증오, 회의와 회한으로 점철된 인생사가 아닌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노란 잎들이 비처럼 후둑 후둑 떨어지는 산책길을 바람과, 그리고 시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닐어 본다.
"헛걸음 기억에 다시 쓴 웃음만..."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드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사십에도 궁티를 못 벗은 나를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바람이 딴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정희성, <길> 전문)
"울지말고 고개들어 하늘을 보아라"
소설 나부랭이 읽는다고 부지깽이로 꾸짖으시던 어머니, 그래도 책이 좋아 옆에 끼고 살았지만 어쩌다가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힘겨운 삶이 내 길이 되었다. 우리말은 점점 잊어가고, 스위스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 독일말은 자꾸 문법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궁티를 벗지 못하는 나의 자화상.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불편한 세상. 그것을 노여워하는 작은 나. 살기가 참 어렵다. 그냥 길을 걸어가기도 참 어렵다. 길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내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기형도, <빈 집> 전문)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가여운 내 사랑, 정말 빈집에 갇혔다. 잘 있거라, 밤, 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열망들아. 나는 여전히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문을 잠근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림, <길> 전문)
"길은 안으로 나 있다"
그렇다. 길은 자주 나를 실망 시켰다.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다.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길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걸어서 온갖 세상살이 구경을 다하게 하고 갑자기 가시밭길을 들이대어 낭패를 보게도 했다. 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창자를 뒤집어 보여줘야 하나, 나도 너처럼 썩었다고
적당히 시커멓고 적당히 순결하다고
비티어온 세월의 굽이만큼 마디마디 꼬여 있다고
그러나 심장 한귀퉁은 제법 시퍼렇게 뛰고 있다고
동맥에서 흐르는 피만큼은 세상모르게 깨끗하다고
은근히 힘을 줘서 이야기해야 하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나도 충분히 부끄러워할 줄 안다고
그때마다 믿어달라고, 네 손을 내 가슴에 얹어줘야 하나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두 팔과 두 다리는 악마처럼 튼튼하다고
그처럼 여러 번 곱씹은 치욕과, 치욕 뒤의 입가심 같은 위로와
자위 끝의 허망한 한 모금 니코틴의 깊은 맛을
어떻게 너에게 말해야 하나
양치질할 때마다 곰삭은 가래를 뱉어낸다고
상처가 치통처럼, 코딱지처럼 몸에 붙어 있다고
아예 벗어 붙이고 보여줘야 하나
아아 그리하여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아직도 새로 시작할 힘이 있는데
성한 두 팔로 가끔은 널 안을 수 있는데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최영미,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전문)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은근히 힘을 줘서 이야기하는 부끄러움, 치욕, 그 뒤의 입가심 같은 위로.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여전히 모른다. 이미 걸어온 길이 있을 뿐이다.
나 돌아갈 수 없어라 너에게로
그리운 사람들의
별빛이 되어
내 굳이 너를 마지막 본 날을
잊어버리자고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울어보아도
하늘에는 비 내리고
별들도 길을 잃어
나 돌아갈 수 없어라
너에게로
(정호승, <길> 전문)
"타인의 길, 나 돌아갈 수 없다"
하늘에는 비 내리고 별들도 길을 잃었다.걸어온 길을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타인들의 길이기 때문이다. 나 돌아갈 수 없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틔워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서정주, <자화상> 전문)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애비는 종이었다. 파뿌리 같이 늙으신 할머니, 바람벽한 호롱불,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세상은 부끄럽기만 하더라.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시의 이슬에 담긴 몇 방울의 피,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이 말이 왜 그리 마음에 들던지... 그래, 나를 키운 건 진짜 팔 할이 바람이다.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 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류시화, <길 위에서의 생각> 전문)
"나그네, 자유에 지쳐 길에 쓰러져"
길 위에 서니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세월을 몰고 멀어져 갔을 뿐이다. 결국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길을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 정말이다.
가당찮은, 참
골목길 잡상인의 리어카에 오글오글
한많은 번데기로 뒹굴지만
새하얀 내 영혼의 집은
수만 갈래의 비단실을 뽑아내고
뽑아내고.......
아직도 기다리며 사는 이웃들
이웃들의 추운 살갗을 위하여
네 고운 색실은 즐겁게 쓰러진다
이 시대의 비단실을 뽑아내겠다면서
오늘도 꾸물꾸물 모여
새파란 이념의 뽕잎을 먹는 누에들
즐겁게 쓰러질 자유가
지금은 쓰라리다
(박라연, <누에> 전문)
"즐겁게 쓰러질 자유가 쓰라리다"
새파란 이념의 뽕잎을 먹는 누에들, 즐겁게 쓰러질 자유가 지금은 쓰라리다. 손등에 난 상처, 분명 지금은 쓰라리다.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전문)
"내가 사는 건 잃은 걸 찾는 까닭"
잃어버린 걸 찾아 길에 나아가지만 남는 건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래도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 잃은 것을 찾기 위함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
속계(俗界)는 불타는 집과 같다고 불가에서 말하지 않던가.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미련 없이 훌훌 털고 가야한다. 헌옷 벗듯이. 잘 살아보자고 온갖 방법(돈, 빽)을 동원해, 치열한 경쟁을 치른 후 봇짐 싸들고 바다 건너와 정신없이 살다보니 배는 불러졌으나, 배만 부르다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잘 산다는 것은 아름답게 사는 것이란다. 부자가 되는 것, 향락을 쫓는 것, 명예욕을 충족하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부에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부와 행복이 생긴다고 소크라테스는 덧붙인다.
종교에 따라 죽었다가 때가 오면 썩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만나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삶은 고달프다.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영원한 삶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해탈한 상태 곧 영원한 순간이 아니겠는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 번뇌와 고통도 함께. 촛불이 다 타면 순간적으로 꺼지듯이. 생자기 사자귀(生者寄 死者歸). 산다는 것은 지상에 잠시 머무는 것. 죽는다는 것은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 나뭇잎들이 그러듯이......